|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로빈슨 크루소
- 건설
- 자전거여행
- 게임
- 스타필드
- 칼럼
- 스팀
- 전략
- 짧은리뷰
- 게임 디자인
- 위버틴
- 매드맥스
- 디볼버 디지털
- 장르_코드_전력
- 노인
- 베데스다
- 식민주의
- 블루_만추 #보이드_바스터즈 #시스템쇼크 #서바이벌_호러 #로그라이트 #한글화
- 등대지기
- 재기드 얼라이언스 3
- 장르_코드_전력_계절
- 테라 닐
- 비디오 게임
- 생태계
- Today
- Total
네크의 무개념 분지
테라 닐(Terra Nil, 2023) - 우리가 떠나고 난 뒤 본문

18세기 영국 작가 '대니얼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당시 팽배했던 식민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는건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무인도이자 처녀지인 '마스 아 티에라' 섬을 이른바 '문명인'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간해나가는 모습은 당시 세계로 뻗어나가며 발이 닿는 곳곳에 깃발을 꽃아넣던 영국 제국의 거울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식인을 일상으로 삼은 미개한 원주민 프라이데이를 주와 문명의 이름으로 개종시킨 로빈슨 크루소의 휘광이란!
당연히도, 시간이 지날수록 '로빈슨 크루소'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당대의 수많은 소설처럼 낡아가고, 이내 수많은 작가들의 손에서 해체되어 재탄생됩니다. 특히 프랑스의 작가 '미셸 투르니에'가 1967년 발표한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서는 문명인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로빈슨 크루소의 적나라한 폭력과, 조그마한 실수에 송두리채 날아가버린 섬 위의 주거지를 보여주며 '문명'의 하찮은 위대함을 조명하고야 말죠.
하지만 게임이라는 미디엄에서 플레이어들은 투르니에의 크루소보다 디포의 크루소에 가까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니, 게임이라는 미디엄이 적극적으로 식민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한다고 봐야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불어닥친 서바이벌-크래프팅 장르의 열풍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나무를 자르고 석탄을 캐 무질서한 황무지 위에서 문명을 일궈내도록 플레이어들을 유도하니까요. 이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하는 행위는 인간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가장 기초적인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완성되지 않고 단순간의 만족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않는 행위보다야 가치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서바이벌-크래프팅 장르 또한, 디포의 시각이 그리한 것처럼 시간에 따라 서서히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이 장르를 좋아하던, 하지만 이제는 이 장르에 질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하는데?'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요.

나무를 베어 도구를 만들고 자원을 캐며 단단하고 강력한 장비를 만들어내는데에 성공하면, 플레이어가 더 할 수 있는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서바이벌-크래프팅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맞이하는 엔드게임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게임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보스를 반복해서 물리치던가, 아니면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강대하고 자동화된 요새를 건설하던가. 새로운 게임을 켜도 이 장르하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장르의 베테랑이던 생존 처음하던 뉴비던 나무를 베어 도구를 만들고 자원을 캐며 모양새가 조금 다를뿐 언제나와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면 곧 깨닫고야 맙니다. 이러한 그라인딩이 더이상 순간의 만족조차 주지 못하는 가치없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점을 말이죠.
그렇기 떄문에 많은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떠납니다.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그리했듯 질서와 순리가 명확한 '문명'으로 돌아가는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깔끔하게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한때 사람이 북적였던 '마인크래프트'의 렐름에 찾아가 본 적 있나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마을주민들과, 화려하지만 맥락이 사라진 수많은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도 열화되지 않은채 사람들이 떠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을 더했을때와 무엇하나 변함없이 말이죠. 점유자가 사라진 거대한 문명은 유적이 되어갑니다.
'테라 닐'은 바로 그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의 이야기를, 질려서 버리고 간, 더이상 할 것이 없는, 찬란한 황무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남기고 떠나야 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테라 닐'은 이른바 테라포밍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건설-전략 게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고 갈라져 풀한포기 나지 않는 땅을 되살리기 위해 풍력 터빈을 세우고 오염을 정화하며 물을 끌어올려 이윽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완성하는게 이 게임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게임이 플레이어를 치하하며 '축하드립니다!'라는 결과 창을 띄워야 할 지점에서 '테라 닐'은 멈추지 않죠. 거기서 더 나아가, 플레이어는 그동안 자신이 일궈낸 문명의 흔적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재활용해, 이윽고 흔적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가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게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임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여러분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느냐에 대한 게임인 겁니다.
분명, 이 게임은 너그럽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려해나가며 진행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이죠. 실수는 대부분 만회 가능하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거대한 맥락 하에서 선택 하나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고 만 일은 사실상 불가역적입니다. 중간 난이도에서 플레이어는 마지막에 한 행동 한번만을 무를 수 있을 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된 생태계의 변화를 억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몇번의 행동을 거쳐서 다시금 이전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플레이어에게 주워진 한정된 자원은 그러한 교정을 시도 할 수록 바닥을 드러내갑니다.
돌아가기 위해 건축물을 정리하는 행동조차 자원을 소모하는 이 게임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에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더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흉물들을 치우지도 못한 체 역할을 갖지 못한 땅에 영원히 묶여있는 겁니다. 이는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폐허와 다를게 없죠. 따라서 이 게임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가 한 행동의 다음을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건물을 여기에 당장 배치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져야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디포의 크루소는 물론이고 투르니에의 크루소보다도 더 앞서나간 사고방식입니다. 이 땅, 무인도, 황무지, 그리고 이 세계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나 방법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야만 하는겁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얼마나 재미있건 영원히 플레이 할 수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테라 닐'에서 플레이어가 주어진 생태계를 복구하고 나면, 플레이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일랑 남기지 않고서 다음 장소로 떠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자립하는 생태계를 남기고 떠나가는거죠. 그리고 단언컨데 이는 그 어떤 크루소가 남긴 문명보다도 위대하고 오래갈 흔적일 겁니다.
허나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거대한 초원이 자라나지도 않고, 수십년간 자취를 감춘 야생동물이 갑자기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황무지를 물려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자연이 남아있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어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아 세상을 가꿀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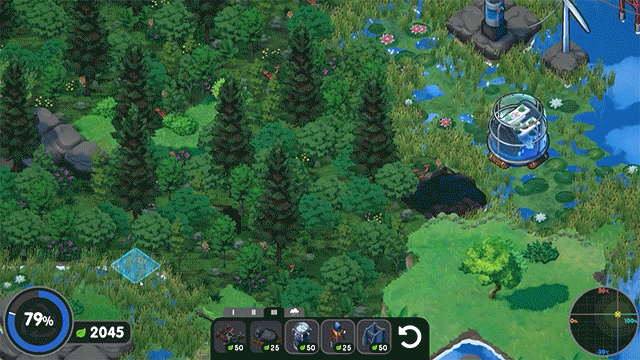
모든 게임은 플레이어를 특정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훈련합니다. 이를 게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테라 닐'은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우리가 떠나고 난 뒤를 생각하게 만드는 몇 안되는 게임입니다. 이 점을, 저는 도저히 싫어할 수가 없군요. 그렇기에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 남은 흔적이, '테라 닐'의 황무지가 아니기를.
'게임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기드 얼라이언스 3, 스타필드(Jagged Alliance 3, Starfield) - 작지만 꽉 찬, 넓지만 텅 빈 (0) | 2023.09.23 |
|---|---|
| GTIL : 앨런 웨이크(Alan Wake) (0) | 2015.04.05 |

